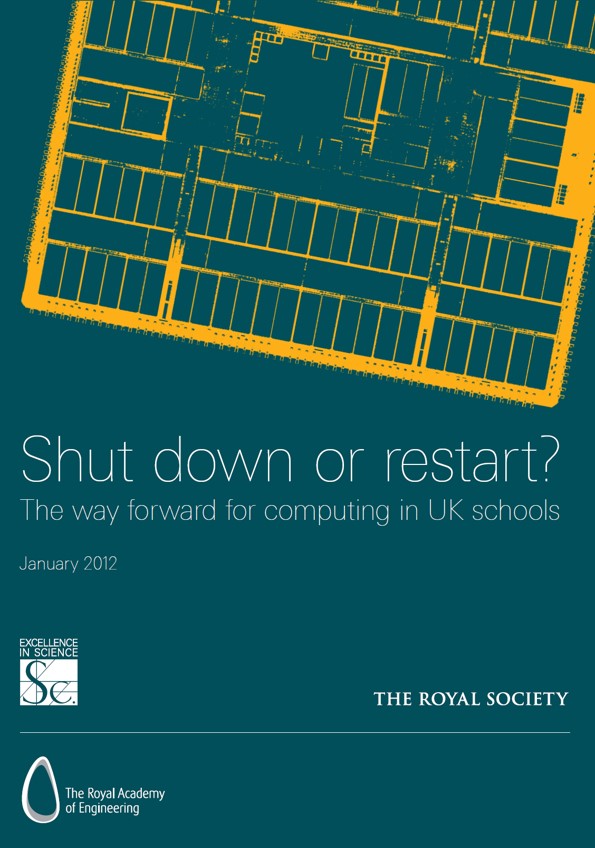9월 19일,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거행되다
영국은 9월 19일을 ‘뱅크 홀리데이(Bank Holiday: 영국의 공휴일을 뜻함, 관공서 및 은행의 휴무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음)’로 지정했다. 바로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II, 1926년 4월 21일~2022년 9월 8일)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여왕의 장례식 전 지난 며칠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일반 조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19일(현지 시각)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여왕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엄수되었다. 수천 명의 참석자 앞에서 장례 예배가 거행되었으며, 이후 잉글랜드 윈저성으로 옮겨 소규모 의식을 치른 후 비공개 하관식을 거쳤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마침내 남편 필립공 곁에서 영면에 들게 되었다.
평소 인기가 대단했던 여왕의 죽음에 영국인들 및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백만 명이 조문에 함께 참석하며 여왕의 죽음을 애도했으며, 이는 곧 전 세계를 가리지 않고 큰 애도 물결을 일으켰다.

왜 우리는 가까운 사이도 아닌 여왕의 죽음을 애도할까?
이 세상에 예외가 없는 단 한 가지의 법칙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상실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여왕과 대화를 나눠 본 적도 없으며 심지어 본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대부분의 영국인들에게도 해당한다. 운 좋게 여왕과 마주쳐서 인사를 한 경험이 있더라도, 본인이 왕실이 아닌 이상 여왕과의 친밀감을 쌓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는 왜 그리고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도 아니며 심지어 본적도 없는 여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을까? 어떻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한 상실감이 깊은 슬픔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자살, 슬픔, 그리고 죽음 등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의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마이클 콜비 박사(Dr. Michael Cholbi)는 그동안의 대부분 슬픔 연구는 부모, 친한 친구 혹은 배우자의 상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관계나 유명인들이나 공인들과의 일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준 사회적 관계(parasocial relationships)의 상실에 대한 슬픔을 연구했다. 이는 마치 연예인들이 불행을 겪을 때 함께 슬퍼해 주는 팬들의 입장과도 비슷한 관계이다. 콜비 박사는 준 사회적 관계 역시 큰 슬픔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슬픔이 상호 관계의 맥락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큰 슬픔이 상호 관계의 맥락 안에서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될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가정 세계(assumption world)의 무너짐
일부 연구에 따르면 준 사회적 관계에서 유발되는 슬픔은 가능성의 상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요크 대학의 철학자 루이스 리처드슨 교수(Prod. Louise Richardson)는 이러한 슬픔의 경험은 전반적인 경험에 대한 일종의 혼란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본인들이 세웠던 가정(assumption)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 세계(assumption world, assumptive world, 혹은 Shattered assumptions theory)'라는 이론을 인용했는데, 위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일종의 가정을 강력하게 세우곤 한다. 리처드슨 교수는 우리가 슬퍼하며 느끼고 있는 상실은 왕비의 죽음에 대한 우리가 세운 가정 세계가 혼란에 빠지며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 콜비 박사는 사람들이 동일한 인식 가치를 채택(혹은 선택)하거나 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취한 입장 등을 존경하기 때문에 공인의 상실을 애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콜비 박사에 따르면 이는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누군가를 잃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일종의 상실감을 넘어서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작은 상실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실에 대처할 때 방어기제가 도움이 된다?
지난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유명인이나 준 사회적 관계인의 상실에는 방어기제 중 하나에 속하는 내사(introjection: 외부의 대상을 자기 내면의 자아 체계로 받아들이는 과정)가 도움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먼 관계를 맺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런던에 기반을 둔 사별(bereavement) 자선 단체 Cruse의 임상 이사(clinical director) 앤디 랭포드(Andy Langford) 역시 결국 내사와 같은 과정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면 사별에 대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준 공인이나 준 사회적 관계를 옹호하기 위해서 계속 그 안에서 살 것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를 통해서 랭포드는 공인에 대한 슬픔은 진정한 슬픔이며 현실적인 감정이라고 덧붙였다.

슬픔의 감소
랭포드 이사에 따르면 여왕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상실감에서 유발되는 슬픔의 경우, 가까운 사람을 잃는 상실감에서 유발되는 그것보다 더 빨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와 형성할 수 있는 유대감이 보통 시간, 근접성 및 친밀감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의존하는데 위 세 가지 측면은 우리가 애도하는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변수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뇌에 위 세 가지를 찾도록 설계되어 있는 뉴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컬럼비아 대학의 장기 슬픔 센터 (Center for Prolonged Grief) 소장 캐서린 시어 교수(Prof. Katherine Shear) 역시 여왕의 죽음에 사람들이 슬픔이 계속되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상태인 장기간의 애도를 할 확률을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리처드슨 교수에 따르면 이에 관해서 여러 이론이 있지만, 이론들에 관해서 정량적인 답변을 찾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여러 변수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시어 교수도 이에 관해서 슬픔은 특정 조건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단어일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 김민재 리포터
- minjae.gaspar.kim@gmail.com
- 저작권자 2022-09-26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