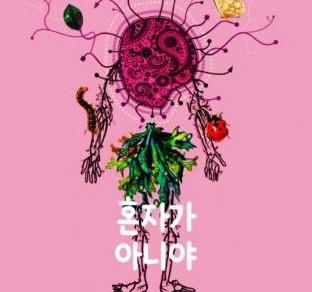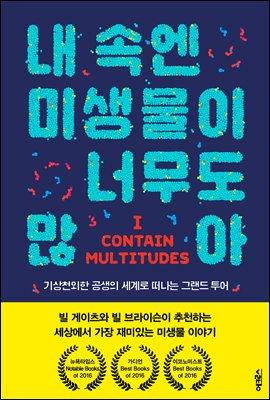땅속에 서식하는 작은 생물들이 있다.
땅속에 산다고 해서 토양균류(soil fungi)라고 하는데 땅속에 살고 있는 세균이나 균류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땅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한 후 흙으로 되돌려 보내는 과정을 통해 자연계 물질순환을 촉진하고 있다. 식물 등 땅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땅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생관계 촉진… 식량 증산 가능해
그동안 과학자들은 이 토양 속에 있는 균류들이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토양 샘플을 통해 토양 균류의 유전자를 채취해 분류하는 식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작은 생물들을 활용해 식량을 증산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미국 에너지국 산하 연구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도 그중의 하나다. 대규모 연구팀을 구성하고 땅속에서 이들 생물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적해왔다.
그리고 최근 토양 균류 중의 하나인 토양 균근균(mycorrhizal fungi) 안에서 농작물과의 공생 관계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이다.
22일 ‘사이언스 데일리’는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과학자들이 균근균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 균류로 하여금 다른 식물과의 공생관계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식물 생장과 결실을 도울 수 있는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균근(mycorrhiza)이란 균류가 붙어서 생육하고 있는 고등 식물의 뿌리를 말한다. 이 뿌리에는 사상균의 일종인 균근균이 서식하는데 자연 생태계의 많은 식물들이 이 균근균과 상호 관계를 형성하며 도움을 얻고 있다.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균근균 균사는 5~15㎝까지 자라나 식물의 뿌리털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이를 수 있다. 식물은 길게 자란 이 균사를 통해 스스로 도달하지 못하는 곳의 양분과 수분을 자체 흡수 효율보다 10배 이상 흡수할 수 있다.
땅속에 저농도로 존재하는 중요한 양분을 손쉽게 흡수할 수 있다. 또한 균근균은 과도한 양의 염분, 독성 금속이온 등의 흡수를 막아주며, 균근근을 통해 항생물질을 생성하게 하고 식물 뿌리 표피의 변환 작용을 통해 병원균에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오크리지 연구소는 논문을 통해 많은 식물 생육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균근균의 유전자를 발견함에 따라 식량 증산은 물론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 논문은 최근 식물 연구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 ‘네이처 플랜츠(Nature Plants)’에 ‘ Mediation of plant–mycorrhizal interaction by a lectin receptor-like kinase’으로 게재됐다.
‘공생’ 메커니즘으로 생태계 복원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균근과 균근류 간의 공생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과정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번의 걸친 유전자 분석을 통해 외근근계 균류인 큰 졸각버섯(ectomycorrhizal fungus Laccaria bicolor) 안에 G 타입 렉틴 수용체(lectin receptor)가 있어 포플러(Populus)와의 공생 관계를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렉틴(lectin)이란 세포막 당단백질이나 당지질과 결합해서, 세포를 한군데 엉키게 하거나 분열하게 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의미한다. 수용체(receptor)란 세포막에 존재하는 특정 구조의 단백질을 말한다.
오크리지 연구소는 수차례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렉틴 수용체의 기능을 결정짓는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향후 식물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많은 농업 관계자들은 연구를 통해 기존 토양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으며, 척박하고 건조한 지역에서 병원균‧해충 등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기로 훼손되고 있는 열대우림, 대초원의 식물들을 되살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풀과 초원의 식물 약 80%가 균근류와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분자유전학자 제시 랍(Jessy Labbe) 박사는 “만일 식물과 토양균류 간의 공생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최근의 가뭄, 병원균과 해충, 지구온난화 등의 재난으로부터 식물을 지켜낼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사는 “1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유전자 분석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식물과 균근류 간의 공생 관계를 더 세밀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식물에 이 공생 관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애기장대(Arabidopsis)의 경우 균근류를 주입했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유사한 종류의 식물들이 토양 균류와의 공생 관계를 거부하는지 향후 풀어야 할 연구 과제다.
그동안 식물학계를 중심으로 한 과학계에서는 지구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으로 식물과 토양균류와의 공생 관계를 활용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크리지 연구소가 공생 메커니즘의 단초를 밝혀냄으로써 공생 관계를 활용한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향후 지구 생태계를 살리고,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강봉 객원기자
- aacc409@naver.com
- 저작권자 2019-07-23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