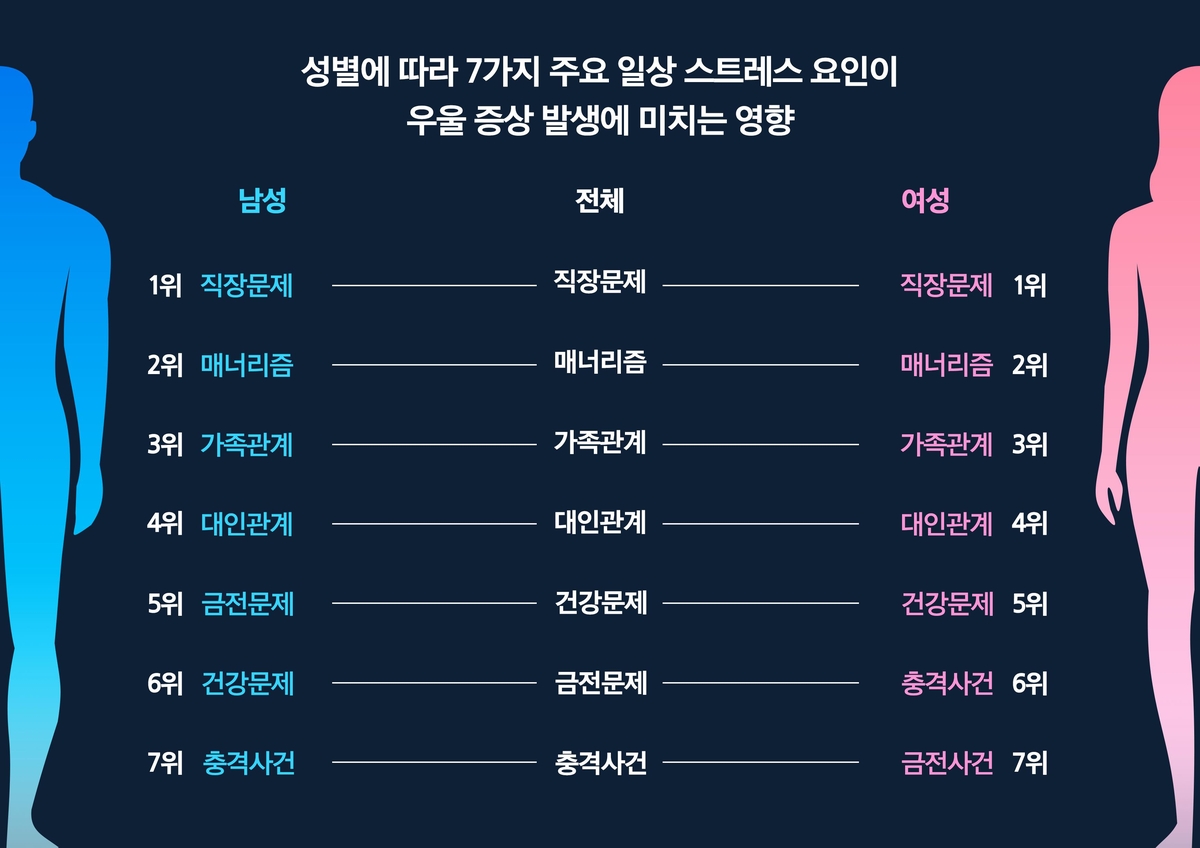우울증 환자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도 그렇지만 뇌 구조도 정상인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어린이병원(CHLA) 사반 연구소 연구진은 우울증 환자의 대뇌 피질이 정상인과 구조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정상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네이처 출판그룹이 발행하는 ‘분자 정신의학’(Molecular Psychiatry) 7일자에 발표된 이 연구는 무작위로 선발한 환자를 대상으로 통제된 임상시험을 실시해 우울증 약물치료 중에 나타나는 대뇌피질의 구조적 변화를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인체 두뇌의 해부학적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 즉 경험이나 자극에 의해 두뇌가 변화하는 능력을 생체 상의 증거를 통해 처음으로 제시했다.

우울 증상 보상 반응으로 대뇌 피질 두꺼워져
이 연구를 수행한 브래들리 피터슨(Bradley S. Peterson) CHLA 정신개발연구원장 겸 남캘리포니아의대 소아과 및 정신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뇌 피질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우울 증상을 줄이려는 보상적 신경가소 반응임을 나타낸다”며, “약물치료를 받는 환자는 두꺼운 대뇌 피질을 가지고 있고, 피질이 두꺼울수록 증상도 덜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물 치료를 하면 증상의 심각성이 줄어들어 뇌에서의 생물학적 보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피질이 더 얇아지고, 건강한 연구지원자들과 비슷한 두께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만성 우울증을 가진 환자 41명에 대해 10주간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의 시작과 마지막에 해부학적 뇌 스캔을 실시하고, 건강한 연구지원자 39명에 대해서는 뇌 스캔을 한번만 시행했다. 이번 연구는 피터슨 교수와 공동연구자인 라비 밴설(Ravi Bansal) 교수 두 사람이 컬럼비아대 교수로 재직할 때 치료한 성인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경가소적 관찰, 정신질환 치료의 새로운 타겟
환자들은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집중력 및 혈류량 등을 증가시키는 노르에피네프린 감소를 억제하는 항우울제(듈록세틴)나 혹은 위약(플라시보) 가운데 하나를 무작위로 투여 받았다. 시험 기간 동안 약물을 투여한 환자는 위약을 받은 환자들에 비해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의 대뇌 피질 두께는 건강한 연구지원자들과 거의 같은 값으로 줄어들었으나, 위약 처방 환자들의 피질 두께는 오히려 약간 두꺼워졌다.
CHLA 연구원이자 남캘리포니아의대 소아과 교수인 밴설 교수는 이 연구 결과가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는 계속해서 우울증상에 대한 보상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밴설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무작위 대조 연구와 MRI 뇌 스캔을 병행한 방법론은 어린이와 성인을 비롯한 모든 인구층에 적용될 수 있다”며, “연구에서 보여준 신경가소성에 대한 관찰은 신경정신 질환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생물학적 표적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 김병희 객원기자
- kna@live.co.kr
- 저작권자 2017-03-08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