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 도시의 삶은 어떻게 지속될까.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온라인 국제행사인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 서밋 2020’이 지난 3일 개최됐다.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과 석학,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방역은 물론 기후 및 환경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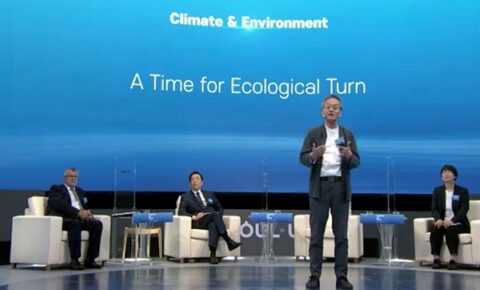
약품 백신 보다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으로 치유
‘생태적 전환(Ecological turn)’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최재천 이화여대 자연과학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 혼란에 대해 “인류는 지금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라고 경고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장본인은 박쥐가 아니라 사람 임을 상기시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역시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퍼나른 존재도 사람이다. 예전 같으면 국지적 유행으로만 끝났을 전염병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약품 형태의 백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개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커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어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전염병이 대부분 진정되므로 제약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 교수는 약품 백신 보다는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 등 2가지 백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행동 백신이란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생태 백신은 연구나 조사처럼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가급적 생태계와 거리를 두는 자세를 뜻한다.
최 교수는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은 약품 백신보다 훨씬 빠르고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백신들”이라고 소개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인 만큼 생태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심비우스로 진화해야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 교수는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이 오늘날의 전염병 창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박쥐를 꼽을 수 있다. 박쥐는 종수(種數)가 워낙 많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인자를 옮기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만 보면 종수의 절반이 설치류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절반, 즉 전체 포유류의 25% 정도가 박쥐인 셈이다.
박쥐의 종수는 원래 열대지역에 많이 존재했다. 박쥐만 빼고 보면 열대와 온대지방에 사는 포유류의 생물다양성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열대에 주로 사는 박쥐의 분포가 넓어지면서 전염병을 일으킬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우한시만 해도 아열대기후이고 박쥐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최 교수는 “기후변화 역시 코로나19처럼 하나의 팬데믹 현상”이라고 밝히며 “금세기 안에 인류가 멸종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은 무시무시한 기후재난을 앞두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 속에서 인류가 찾아야 할 생존의 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문명 우선주의’가 아닌 ‘공생 우선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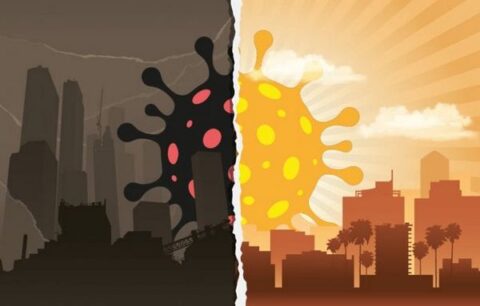
최 교수는 “흔히 인류를 가리켜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 즉 현명한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현재의 인류는 현명하기는커녕 죽기 위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불나방과 비슷하다”라고 지적하며 “그런 자화자찬은 이제 그만하고 다른 생명체들과 공생하겠다는 뜻의 ‘호모심비우스(Homo symbious)’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첨단 디지털 세상을 꿈꾸며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이나 ‘정보의 전환(informational turn)’ 같은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일으킨 파장이 너무 커져 이제는 어떤 전환도 무의미해진 것이다. 오로지 빠른 ‘생태적 전환’만이 유일한 인류의 생존 경로가 된 것이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최 교수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려면 극단적 충격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산업계에서는 흔히 친환경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를 넘어서는 환경 중심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환경친화적이라는 소극적인 대처 방법보다는 생태를 경제활동의 중심에 두는 ‘생태중심적(eco-centered)’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준래 객원기자
- stimes@naver.com
- 저작권자 2020-06-04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