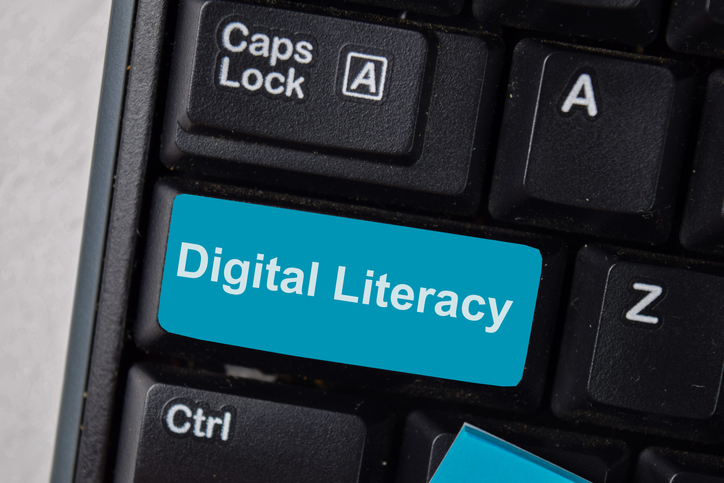최근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이 있다. ‘논문 발표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과학 발전은 그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을까?’라는 것.
‘포브스(Forbs)’ 지는 최근 Q&A 플랫폼 ‘쿼라(Quora)’에 올라온 이 같은 질문에 주목했다. 그리고 28일 ‘쿼라’에 게재된 생체심리학자 이스라엘 라미레즈(Israel Ramirez) 박사의 답변을 게재했다.
그는 인텔(Intel)의 공동 창업자인 고든 무어(Gordon Moore)를 예로 들었다.
무어는 마이크로칩의 용량이 매년 2배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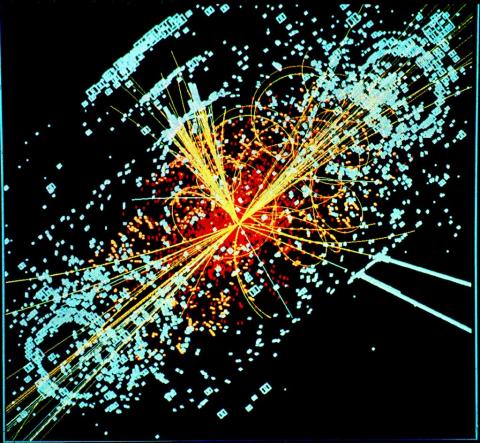
연구 성과 나오기까지 더 오랜 시간 걸려
1968년 동료들과 함께 인텔을 설립한 고든 무어는 1971년 2300개의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칩으로 묶은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한 이후 실제로 자신이 공언한 ‘무어의 법칙’을 입증했다.
그가 세운 회사 인텔도 발전을 거듭해나갔다. 무어는 1975년 자신의 주장에 무리가 있음을 알고 1년으로 설정했던 주기를 2년으로 수정하지만 수정된 법칙 역시 30여 년 간 증명을 거듭해나갔다.
‘무어의 법칙’이 어긋나기 시작한 때는 2012년이다.
2008년 45나노 공정에서 2010년 32나노 공정, 2012년에는 22나노 공정으로 순조롭게 공정 미세화가 진행됐으나 그 다음 단계인 14나노 공정의 반도체는 2014년이 되어서야 양산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무어의 법칙’이 깨졌다는 사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CPU 생산을 주도해온 인텔의 명성 역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세계 CPU 시장은 경쟁업체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기술발전의 속도가 지체되면서 ‘무어의 법칙’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과학 현장 곳곳에서는 무너진 ‘무어의 법칙’과 유사한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체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 곳이 제약 분야다.
의약품 개발 비용이 늘어나고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갈수록 느려지고 있는 중이다. 과학자들은 의약계에서 ‘무어의 법칙’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이런 현상을 ‘이룸의 법칙(Eroom’s Law)’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이룸(Eroom)’은 ‘무어의 법칙(Moore’s law)’에서 ‘무어(Moore)’란 단어 영어 철자를 거꾸로 읽은 것이다.
생명공학 통계에 따르면 지난 40여 년간 신약물질을 만드는 데 소요된 R&D 예산은 9년 단위로 두 배씩 증가했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의약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FDA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연구과제 선정 까다로워진데다 비용 급증
이룸의 법칙은 결국 기술발전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개발 비용 및 어려운 인증절차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라미레즈 박사의 분석이다.
라미레즈 박사는 이런 현상이 제약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과학 분야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새로운 연구 결과를 입증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룸의 법칙이 일반화되고 있는 이유는 또 있다.
무엇보다 이전에 풀어야 했던 과학적인 의문들은 상당 부분 해소돼 있는 상태다. 남아있는 연구 과제들을 보면 대부분 난제들이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만큼 과학적 성과도 그만큼 느리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장비 문제도 심각한 이유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첨단 장비가 요구되지만 이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연구를 위해 첨단장비를 찾아 헤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구 기준(Research standards) 역시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연구 윤리, 사회적 규범 등이 구체화되면서 동물 실험은 물론 각종 복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연구현장에는 최근 각종 통계적 방식(Statistical methods)이 도입되고 있다. 이 방식은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통계적으로 중요한 연구 성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비를 투자하는 기관의 보수적인 성향도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있기까지 과감한 아이디어나 모험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런 모험을 즐기지 않는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비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논문 현황(NSI)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한국인에 의해 발표된 논문 수는 5만9628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발표된 전체 논문 수의 2.62%에 해당하는 것이고 순위로 보면 12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수많은 논문은 대부분 유사한 분야, 유사한 방향을 다룬다. 새롭고 획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기존의 논문에 약간의 새로운 사실을 끼워 넣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라미레즈 박사는 많은 과학자들이 비용 및 연구 기준, 과제 선정 문제 등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미레즈 교수는 연구자들의 고심을 풀어주기 위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강봉 객원기자
- aacc409@naver.com
- 저작권자 2018-09-28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