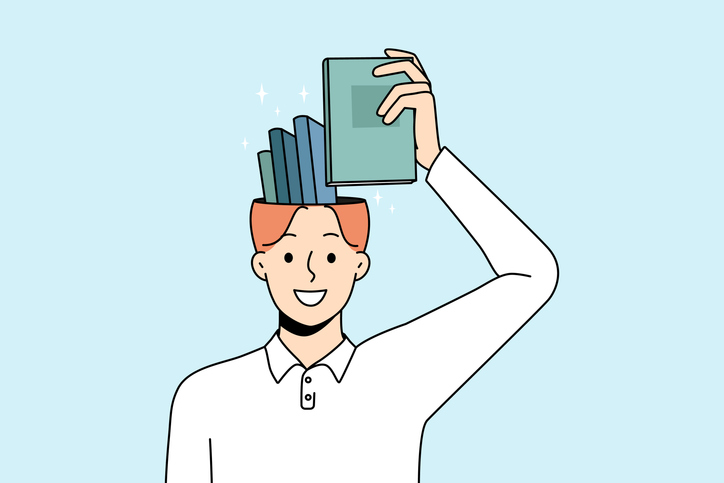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란?
사람은 누구나 외상(trauma)을 겪은 후, 이에 관한 결과로 죄책감, 수치심, 우울감, 불안 등 부정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외상 후 1달이 지난 후에도 지속이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외상을 극복하려 노력하여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이해와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이를 외상 후 성장(PTG: Post-Traumatic Growth)이라고 부른다.
오랜 연구들에 따르면 외상 후 성장을 시련으로부터 ‘회복(역경이나 외상 사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이전의 기능 정도로 회복하는 단계)’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외상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변화를 포함한다.

외상 후 성장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 또는 가치관에 지속적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예를 들면, 개인은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업무 성취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외상 후 성장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예측된다.
저마다의 역치가 다르듯이 외상을 극복하는 데 쓸 수 있는 본인만의 역량도 천지 차이이다. 또한,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우리 인간은 다양한 주변 변수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
이에 전 세계 각지 연구원들은 외상 후 성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십 년간 진행해왔다.
보다 장기적인 PTG는 가능할까?
심리학자 로라 블랙키 박사(Dr. Laura Blackie)와 성격 심리학자 네이썬 허드슨 박사(Dr. Nathan Hudson) 역시 삶에서 중요한 사건, 특히 어려운 사건에 대한 경험을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먼저 연구팀은 본 연구에 앞서 52%의 사람들이 다양한 역경을 겪은 후 중간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만 이러한 외상 후 성장으로 인한 변화의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어 “긍정적인 변화 및 능력들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블랙키 박사와 허드슨 박사는 역경을 겪은 후 사람들이 16주 동안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종적을 추적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두 그룹의 샘플을 모집했다. 한 그룹은 연구 직전 한 달 전에 트라우마를 경험했고 그것이 상당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 무력감 또는 공포를 야기했다고 보고한 그룹이며, 두 번째 그룹은 과거 트라우마 노출이 있었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트라우마 관련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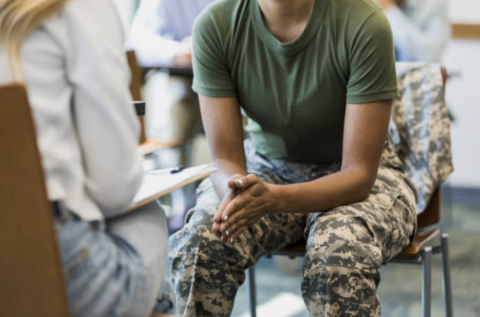
연구팀은 외향성(extraversion), 정서적 안정(emotional stability), 성실성(conscientiousness), 경험에 대한 개방성 (openness to experience), 친화성(agreeableness)과 같은 “빅 파이브(Big Five 혹은 5가지 성격 특성 요소-Big Five personality traits-라고 불림)” 성격 특성의 변화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참고로 빅 파이브가 높은 개인은 일반적으로 자신감 있고, 침착하며, 조직적이며, 지적으로 호기심이 많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 파이브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현명한 사람이 더 행복할까?”)
위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에 따라 성격 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외상 후 성장을 다섯 가지 성격 특성 요소의 증가, 즉 긍정적인 성격 변화로 정의했다. 참고로 이러한 의지적인 성격의 변화는 안정감(well being: 심리학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감정 등을 의미)의 증가와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연구 시작 전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성격 특성을 바꾸려는 목표를 세운 개인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성격 변화를 관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외상 후 성장은 매우 어렵다?
연구팀은 충격적인 사건의 영향과 중요성, 사회적 지원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조사하여 긍정적인 성격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다. 연구팀은 결과가 매우 놀라웠다고 평가한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외상 후 성장’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먼저 자신의 트라우마가 자기 삶에 중심적이고 자기 정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개인들 사이에서 ‘성실성’이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또한, 대조군보다 최근 트라우마에 노출된 개인과 성격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개인의 친화성도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즉, 외상 후 성장이 가능하다고 뒷받침되는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은 셈이다.

사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연구팀이 최근 15건의 실증적 연구를 검토한 결과, 역경을 겪은 후 단기간에 긍정적인 성격 변화가 나타난다는 증거가 매우 제한적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들은 특히 역경 후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된 공감(empathy), 지혜(wisdom), 연민(compassion)과 같은 대인 관계 특성을 포함하여 훨씬 더 광범위한 성격 특성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개인의 성격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선행 연구들의 잠재적인 한계점
블랙키 박사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너무 어둡게만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외상 후 성장’이 심리학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개념이지만 위 결과는 이러한 개념이 심리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과 결과를 보여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녀는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결과는 여전히 회복력에 대한 우리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그녀는 과거 연구의 잠재적인 한계점에 관해서 꼬집는다.
첫째로, 성격 특성의 긍정적인 변화가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성격 특성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일 수 있기에 ‘목표’나 ‘삶의 우선순위’에 비해 외상 후 변화에 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위 연구들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 수행된 연구들이라는 점이다. 역경 이후에 특성 변화들은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위 연구 중 소수의 연구만이 기본 특성 수준을 측정하는 ‘전향적 종단 연구 설계(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design)’를 통해서 수행되었음이 연구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종적 연구 없이는 트라우마가 어떻게 성격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주장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상 후 성장이 드물다면 개인은 죄책감이나 고통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블랙키 박사는 이러한 제한점을 감안하고, 연구 결과가 만약 사실이라는 가정(외상 후 성장이 매우 드물다는 가정)하에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을 예측했다.
이러한 결과가 사실이라면 외상 후 성장이 드물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개인이 역경에 대해서 탄력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선 설명처럼 여러 연구에서 성격들이 쇠퇴하지 않았고 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외상 후 성장이 드문 경험이라는 것이 널리 인정된다면 이를 극복하려는 개인이 느꼈던 죄책감이나 고통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트라우마 경험에서 더 강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 개인들은 (혹은 트라우마 후 성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크게 낙담하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블랙키 박사는 이는 결코 외상 후 성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목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외상을 겪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이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후속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논문 바로 가기 - Blackie & Hudson 2022: “트라우마 노출과 의지적 성격변화의 관계에 관한 단기 효과 (The Relation between Trauma Exposure and Short-Term Volitional Personality Change)”
- 김민재 리포터
- minjae.gaspar.kim@gmail.com
- 저작권자 2023-03-02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