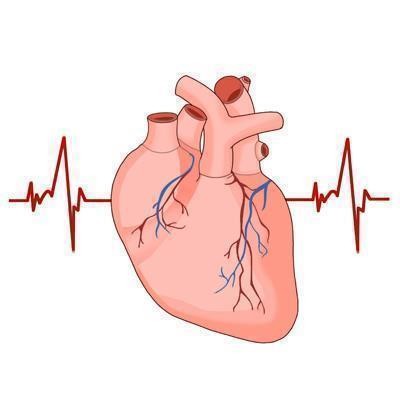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6.4%를 차지하는 일본은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이에 따라 치매, 독거사(獨居死), 노인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급격한 고령화, 도시화에 따라 성인병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14년도에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비율이 미국을 앞지르면서 건강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과 일본이 고령화 및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정보기술(IT)-바이오 기술(BT) 융합, 로봇,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다.
일본, 치매 예방·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세계 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내놓은 첫 치매 지침서에 따르면 현재 일본 치매 인구는 500만 명에 달한다. 2025년이 되면 치매 인구는 7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일본 헬스케어 시장은 치매 관련 업종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컨설팅 기관 시드 플래닝(Seed Planing)에 의하면 치매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6년 230억 엔(한화 약 2493억 원)에서 2025년 679억 엔(한화 약 7360억 원)으로 급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유미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오사카 무역관(일본 K-LABO 대표)도 최근 일본 헬스케어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분야가 바로 치매 관련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콘퍼런스 룸(북)에서 열린 ‘중-일 화장품·헬스 케어 국제 세미나’에서 “최근 일본의 가장 큰 사회문제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치매 관련 헬스케어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치매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첨단 IT 산업을 도입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AI) 로봇 분야이다.
치매 예방 로봇은 기관이나 병원 등에서 환자들과 함께 놀이하고 소통하는 인지훈련을 통해 치매 예방을 돕는다.
국립 장애인 재활센터 연구소와 NEC, 도쿄대가 개발한 파페로(Papero), 소프트뱅크 AI 로봇 페퍼(Pepper)의 치매 버전 페퍼 브레인(Pepper-Brain), 혼다 아시모(ASIMO) 등이 대표적인 치매 예방 로봇으로 활약 중이다.
앞으로 가정에 보급될 AI 치매 로봇은 환자의 무단 외출 시 알림 서비스, 인지 증진을 위한 대화 및 훈련, 약 복용 안내 서비스 등이 프로그래밍될 전망이다.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운동이다. 일본은 효과적인 치매 예방과 더불어 건강 지표를 관찰해서 밀착 지원해주는 ‘디지털 헬스 코치’가 성행 중이다. 디지털 헬스 코치는 활동량, 수면 시간, 심박 수, 체중 변화 등을 공유 받아 이에 따른 운동 및 식단 처방을 메신저로 관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엄유미 무역관은 “디지털 헬스 코치는 1:1 혹은 1:3으로 스파르타식으로 혹독하게 밀착 지원한다”며 “디지털 헬스 코치 시장은 최근 그룹화, 체인화되면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 융합한 헬스케어 성장
중국은 ‘헬스 차이나(Health China)’라는 기치 아래 헬스케어 산업에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급격하게 고령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성인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과 바이오 공학을 융합한 IT-BT 기술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의 영역을 파괴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경영행정대학 중국학과 교수는 지난 5일 열린 ‘중-일 화장품·헬스 케어 국제 세미나’에서 “최근 중국의 헬스케어 시장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웰니스(Wellness)’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웰니스란 웰빙(well-bing)과 행복(happi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뜻한다. 중국의 ‘맞춤형 웰니스 케어’는 정보 기술(IT)과 바이오 기술(BT)을 융합해 맞춤형 헬스케어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중국의 스마트 의료 비즈니스 생태계의 중심이다. 중국 시장 내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3000개를 초과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오프라인과 연계한 O2O 의료 서비스, 약품 배송, 의료 관광 시장이 발전하며 온오프라인 영역 파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텐센트는 의약업체인 ‘상하이 의약 클라우드 헬스’와 협업해 인터넷을 통한 의료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두는 O2O 의료 정보 서비스를 시작으로 스마트 원격 진료 서비스, 유전자 분석을 토대로 신약 연구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알리바바는 제약사와 연계를 통한 헬스케어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 병원’ 프로젝트를 통해 병원 접수, 진료, 수납에 이르는 과정을 디지털 서비스로 제공할 전망이다.
박승찬 교수는 “앞으로 중국은 인공지능(AI), 생명공학(BT),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의료기기를 상용화하는 한편 양로산업에 스마트 의료 산업을 연계해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전망했다.
- 김은영 객원기자
- teashotcool@gmail.com
- 저작권자 2019-07-08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